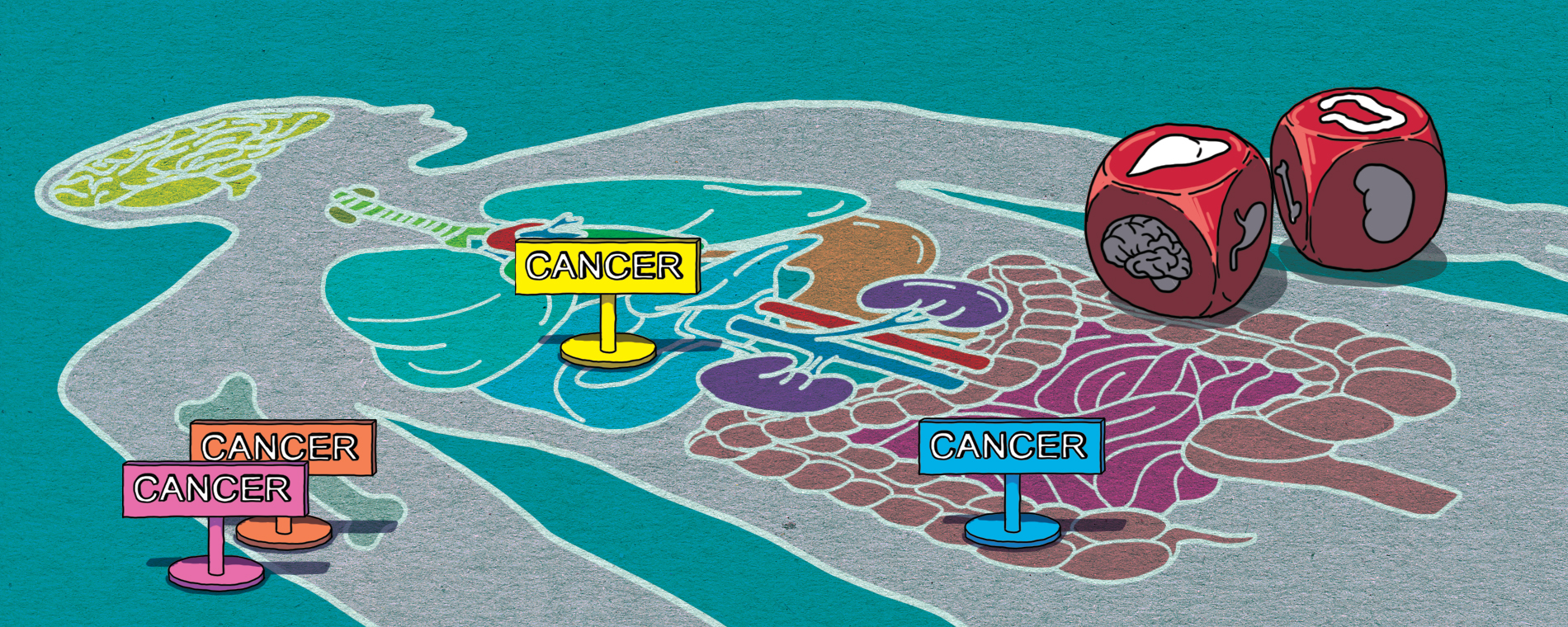 [Source: https://horizon.kias.re.kr/8351]
[Source: https://horizon.kias.re.kr/8351]
청명한 가을날 국가기간시설의 일부인 저유조 하나가 검은 연기와 함께 전소되었다. 간헐적인 폭발과 화염이 17시간이나 지속되며 많은 이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실인즉, 전날 밤 800여 미터 인근 초등학교의 ‘아버지캠프’에서 풍등이 날아올랐다. 불씨가 꺼진 채 주변의 공사장에 불시착한 풍등은 이튿날 호기심어린 한 젊은 노동자의 손에서 다시 한번 날아올랐고 확률의 장난은 풍등이 품은 살아있는 불씨를 정확히 저유조로 날려 보냈다. 불행 중 다행이랄까 자칫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 사건의 전모는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제 사건은 사법과 책임소재에 관한 논쟁으로만 남은 듯하다.
2000년 여름, 에어프랑스의 콩코드 여객기가 샤를 드골 공항을 이륙한 지 2분이 채 못 되어 화염에 휩싸인 채 추락했다.[1] 일 년 반 동안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콩코드 이륙 5분 전 같은 활주로에서는 콘티넨탈 항공의 DC-10 여객기가 뉴어크를 향해 날아올랐는데 이때 비행기의 엔진 덮개로부터 길이 40센티미터 남짓 되는 끈 모양의 티타늄 합금 부속이 이탈되어 활주로에 떨어졌다. 비운의 콩코드는 이륙하면서 바로 이 쇠붙이 파편을 밟았고, 곧이어 파열된 타이어가 연료탱크를 타격하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이었다.
아버지캠프와 활주로에 떨어진 보일 듯 말 듯 한 쇳조각이라니! 사건·사고들을 개연성과 증거로 충만한 시나리오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사실 온전히 과학자들의 일상이기도 하다. 그것이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극적인 사고이든, 암의 발병과 같은 개인적 불운이든, 굳이 그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만의 본성인 듯하다. ‘인과’라는 관념의 틀을 획득한 것이야말로 인류 지성사의 일대사건이었고, 이는 지금과 같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의 시대에도 기계가 흉내 내지 못하는 ‘인간됨’의 최후 보루이다. 튜링상을 수상한 컴퓨터과학자이며 Bayesian network라는 개념을 창시한 유디아 펄Judea Pearl이 최근작
“잔디가 젖었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것이 아니라) 비가 왔을 확률이 얼마인가?”라는 지극히 ‘건조한’ 조건부확률 문제도 판정의 언명에 이르면 인화성이 큰 논점이 되곤 한다. 누군가 암에 걸렸을 때, 그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유전자 때문인지, 이를테면 오래도록 꾸준히 마셔댄 진로소주 탓인지, 아니면 그냥 운이 없었던 탓인지를 실제로 물은 논문이 있다. 2015년과 2017년 <사이언스>를 통해 소개된 논문 두 편[3][4]에서 존스홉킨스 의대 연구진은 ‘운이 나빠서’ 걸리는 암이 3분의 2는 된다고 결론지었고“…66% of driver mutations are due to replication…”, 이후 2018년 시월 현재까지 수백 편의 반박, 재반박 논문들이 이어지고 있다. 노벨상을 제외한 생물학 분야의 저명한 상을 두루 다 받은 저자가 이제 노벨상에 욕심을 내어 무리하는 것이라는 비아냥도 어느 학회에서인가 들은 듯하다.
하기야 지금 이 시점에도 전 세계적으로 암 연구에 퍼부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세금이 얼만데 운수소관이라니 이 무슨 허망한 소린가? 섭생을 챙기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다 헛것이란 말인가? 하지만 저자들이 보여준 것은 인체 조직별 암 발병 빈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생 동안의 암 위험도가 (다른 무엇보다도) 각 조직의 줄기세포의 분열회수와 상당히 강한 정도로 연관되어 있다는 통계적 관찰이다. 세포가 분열을 준비할 때 30억 쌍에 이르는 염기서열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을 수 없고, 돌연변이는 세포가 분열을 많이 하면 할수록 누적될 것이다. 나이에 따라 암 발병의 위험이 단조증가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포겔슈타인Bert Vogelstein의 논문은 암과 같은 극적인 불운의 상황이 유전자라는 천성nature과, 양육nurture이나 식이와 같은 환경요인을 능가하는 정도로 운수chance 혹은 확률의 장난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암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의 중요성을 부정한 일도 없다. 오히려 소아백혈병이나 소아림프종과 같이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조차도 환자의 부모가 자책할 일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며, 설령 ‘나쁜’ 유전자를 물려주었다 한들 이미 우환을 안고 사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원인 제공자라는 비난은 온당치 않다는 위로의 메시지다. 적어도 단 한 번의 돌연변이로 암이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불운의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다 해도 화룡점정의 사건이 환경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면 암은 분명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다.
이는 부모의 육아방식이 아이들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리학자의 관찰연구나 일란성 쌍둥이집단에 대한 유전학적 종단연구의 결과와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두 연구에서 공히 얻은 결론은 유전자나 양육방식이 아이의 현재를 적어도 비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또 거꾸로 아이의 성정이 부모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이의 장래는 아이가 부모와는 독립적인 개체인 이상 피할 수 없는 확률적 요동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운칠기삼’이란 우스갯소리부터 과학의 최전선에 이르기까지 사실 운수소관은 도처에 있다. 미생물 세포 하나가 두 개의 딸세포로 분열할 때 모세포의 모든 자원이 두 딸세포에 정확히 1/2씩 돌아갈 것인가? 왜 한 딸세포는 단백질 P를 7개 물려받고, 다른 딸세포는 3개만 받았을까? 유전자에 그렇게 쓰여 있었던 걸까?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배경공간의 좌우(상하)대칭성이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일반독자라도 되물을 줄 안다. 그게 뭐 이상한가, 꼭 5:5이어야 하냐고. 세포집단 전체의 평균은 5:5의 규칙을 따르겠지만 개체의 수준에서는 확률적 요동을 피할 수 없다. 굳이 왜 7:3이었나에 대한 원인을 말하고자 한다면 운수 말고 다른 무엇이겠는가?
게다가 마침 변화된 환경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5개 이상의 P단백질 분자가 필수적이라면, 확률적 요동의 문제는 단지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작위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미생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흔히 겪는 상황이다. 유전자의 발현을 포아송 확률과정Poisson process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또한 회로에서 산탄잡음shot noise의 문제이기도 하다. 산탄잡음을 잘 들여다보면 응집물질 내 전자 간 상호작용이나 양자역학적 얽힘상태entanglement 같은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발현시스템에서 보이는 ‘잡음’은 유전자 네트워크에서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이나 세포 내 생화학반응의 동역학적 디테일을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5] 중시계mesoscopic system이론과 정보의 소실에 동반되는 열적 흩어짐thermal dissipation에 관한 연구로 굵은 족적을 남긴 IBM의 과학자 롤프 란다우어Rolf Landauer가 일찍이 말했듯 “잡음이 (곧) 신호다”.[6]
똑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고 (거의)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세포분열 당시 ‘삐끗하는’ 바람에, 혹은 하필 어떤 이유로 P를 발현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는 바람에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스러진 세포가 있다면 어디에 그 탓을 돌려야 할까? 염기서열이나 후성유전학적epigenetic 변이로 DNA에 남은 그 무엇도 아니고 적어도 인근의 미생물들이 다 함께 겪었던 환경 탓도 아니다. 직접적 원인은 P 결핍이겠지만 P 결핍을 불러온 것은 운수소관이랄 수밖에.
역설처럼 들리겠지만 과학에서 정량적으로 인과관계를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스피노자, 라이프니쯔, 흄, 칸트로 면면히 이어져 온 철학적 담론과는 달리, 변수들 간의 조건부 예측가능성을 토대로 한 위너Norbert Wiener의 인과성을 통계학자 그레인져Clive Granger가 정량화한 것은 1969년의 일이었다.[7] 그는 경제학적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량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 공로는 2003년,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국립은행 경제학상, 소위 노벨경제학상 수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결정론적 세계관에 대한 거부감이었을까? 상관관계correlation와 인과관계causation 사이의 간극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난감해 보이는 것은, 어쩌면 상관관계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인과적 추론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미미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다. 한편으로 앞서 말한 운수소관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의견이 분분하다.[8]
반복된 관찰을 통해 닭이 울면 해가 뜬다는 것을 누구랄 것 없이 알고 있었고, 일세를 풍미한 노정객老政客이 아니었어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것쯤은 간파했다. 닭이 우는 것과 새벽이 오는 것이 서로에게 얼마만큼 원인이고 결과인지는 굳이 숫자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체득하고 있는 경험칙에 속한다. 그러나 본지 2018년 5월 14일 자에 실린 박권의 ‘믿기 힘든 양자 Incredible Quantum [4]: 게이지 대칭성’에 실린 사연은 어떠한가? 저자가 예정에도 없던 해외유학길에 오르게 된 것이 학부 시절 교양체육 수강을 마다하고 일본 견학을 갔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아들 대니얼을 잃은 비운의 부친이기도 한 유디아 펄은 굳이 묻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대니얼 펄 기자가 파키스탄에서 참수당해야 했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나? 단지 순진한 한 언론인의 판단 착오가 불러온 비극이었던가? 팍스 아메리카나의 그늘? 그 이전 대영제국의 식민정책? 아니면 그옛날 로마제국에 대항하여 예루살렘을 잠시나마 해방시켰던 바르 코크바의 난? 더 거슬러, 디아스포라 유태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펄 자신의 업보이고 카르마였던가? 전쟁과 분단의 상흔을 물려받고 살아온 한반도 거주민의 부질없는 상상: 삼국통일의 주체가 신라가 아닌 고구려였다면 사정이 달라졌을까? 문제는 이를 검증할 역사의 앙상블 혹은 레플리카가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운수소관을 고려하지 않는 천성-양육nature vs. nurture 논쟁은 마치 천성이나 양육의 요소(중의 하나)를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불완전하고, 또한 문제의 해결을 오도할 수 있다는 것이리라.
참고문헌
[1] https://en.wikipedia.org/wiki/Air_France_Flight_4590
[2] Pearl J, Mackenzie D. The Book of Why: The New Science of Cause and Effect (Basic Books, 2018).
[3] Tomasetti C, Vogelstein B. Variation in cancer risk among tissues can be explained by the number of stem cell divisions. Science 347(6217): 78-81 (2015).
[4] Tomasetti C, Li L, Vogelstein B. Stem cell divisions, somatic mutations, cancer etiology, and cancer prevention. Science 355(6331): 1330-34 (2017).
[5] Munsky B, Neuert G, van Oudenaarden A. Using gene expression noise to Understand Gene Regulation. Science 336(6078):183-187 (2012).
[6] Landauer R. The noise is the signal. Nature 392: 658-59 (1998).
[7] Granger, CWJ. Investigating causal relations by econometric models and cross-spectral methods. Econometrica 37(3): 424–38 (1969).
[8] Forber P, Reisman K. Can there be stochastic evolutionary causes? Philosophy of Science 74: 616-27 (2007).
